
시간을 흘려보내면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온다는 말은 모순 같지만 사실이다. 원래 모든 미래는 과거를 품고 있는 법이니까.
정영수의 애호가들은 8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읽고 나면 이상하게도 “여덟 편을 읽었다”기보다 “하나의 사유를 여덟 번 다른 각도로 비춰본 것 같다”는 감각이 남는다. 각 편의 사건은 서로 다르고 인물도 다르지만, 반복해서 돌아오는 질문들이 있다. 우리가 무엇을 애호하는지, 애호한다는 말이 얼마나 쉽게 취향의 깃발이 되면서 동시에 얼마나 자주 생의 공포를 가리는 천이 되는지. 그리고 변해야 하는 것들은 결국 변한다는, 어쩐지 너무 단순해서 더 무서운 사실.
오로지 작품 그 자체만이 스스로 고유하게 존재한다는 생각, 그래서 어떤 언어로 되어 있든 각 문장이 가리키는 의미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은 번역가의 태도로는 이해되면서도, 소설의 독자로서는 자꾸만 의심하게 된다. 정말로 의미는 하나일까. 정영수의 문장들은 대체로 의미가 하나로 수렴되는 순간보다, 의미가 한 번 번역되는 순간에 미세하게 흔들리고 비켜나는 순간을 오래 붙잡는다. “원문이 가리키는 의미와 어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문장을 읽으며,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게 된다.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이야말로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버팀목이고, 동시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문학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번역은 기술이 아니라 거의 신앙에 가깝다.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번역은 논란의 여지없이 중요한 작업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정 시대, 특정 언어권에 갇힌 작품을 다른 시대와 언어권에 존재하게 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획득하게 하는 유일한 행위. 이 대목이 흥미로운 건, 애호가들이 말하는 “보편”이 결코 따뜻한 합의로 도착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보편은 자주 상실과 오해와 실패를 통해서만 겨우 스치는 형태로 나타난다. 서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고 애쓰는 움직임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연장시키는 근거가 된다. 이 소설집에서 인간은 서로를 완전히 번역하지 못하면서도 번역하려고 든다. 그게 사랑이든 우정이든 혹은 단순한 호기심이든. 그리고 그 노력의 어색함이, 이 소설집의 정직함이 된다.
변해야 하는 것은 언젠가 변한다. 변신하는 것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나는 것은 그 정도뿐이었다.
이 말은 냉소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생존의 기록처럼 들린다. 변한다는 것은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견딜 수 없어서 밀려오는 어떤 힘에 가깝다. 그래서 변신하는 자는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다. 제정신인 채로는 지금의 자신을 계속 살 수 없을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형태를 상상하게 된다. 애호가들은 그 변신을 “성장”이나 “치유” 같은 단어로 미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하며 때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해지는지를 담담하게 보여준다.
오하나가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이토록 긴 삶과 반복되는 매일을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고 말하는 장면은, 이 소설집의 온도를 결정한다. 여기서 놀라움은 감탄이 아니라 경이와 공포가 섞인 표정이다. 반복되는 매일을 견디는 능력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적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정영수의 인물들은 대단한 일을 해내지 않는데, 그게 오히려 대단해 보인다. 삶은 특별한 사건으로 구성되지 않고, 대부분은 같은 하루의 변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변주를 견디는 방식이 각자의 “애호”가 된다. 누군가는 언어를 애호하고, 누군가는 취향을 애호하고, 누군가는 어떤 사람의 버릇이나 목소리를 애호한다. 하지만 그 애호는 대개 결코 순수한 취미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애호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는 손잡이다.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상 모든 것이 우연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세상이 생겨난 이래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다. 이 간결하고도 명백한 명제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우연이 너무 많아서 우연이 평상시가 되어버린 세계. 이 소설집은 그 우연들을 “인생의 반전”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대신 우연이 삶의 재료가 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만나지 않았어도 됐을 사람을 만나고, 하지 않았어도 됐을 말을 하고, 그 말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번역처럼 아주 미세한 선택이 다음 문장을 다른 방향으로 데려가는 식으로. 결국 우연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인정하는 순간, 어떤 종류의 체념과 어떤 종류의 자유가 동시에 생긴다.
그래서 애호가들은 소설집이라기보다, 번역과 변화와 우연을 매개로 인간의 “견딤”을 관찰한 기록처럼 읽힌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애호함으로써 오늘을 버티는가이다. 그리고 그 애호는 종종 너무 인간적이라서, 너무 사소해서, 그래서 오히려 진짜처럼 느껴진다. 삶이 거창한 의미로 설명되지 않을 때, 남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니까. 언어의 온도, 한 문장을 더 정확히 옮기고 싶다는 집요함, 미치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놀라움, 우연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받아들이는 체념과 그 체념이 만들어내는 작은 여백들.
그녀는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하나는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이토록 긴 삶과 반복되는 매일을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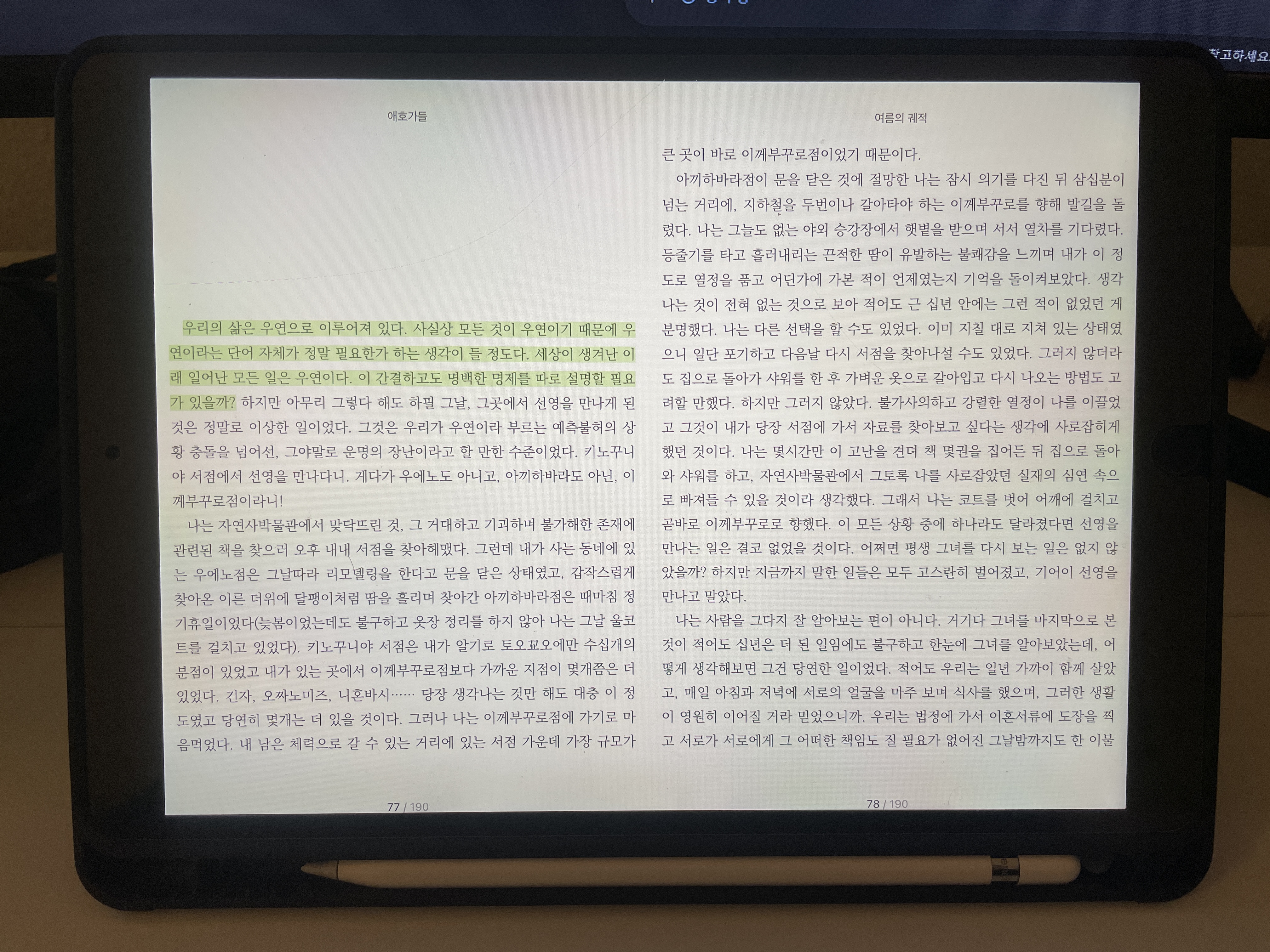
《애호가들》, 정영수, 창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