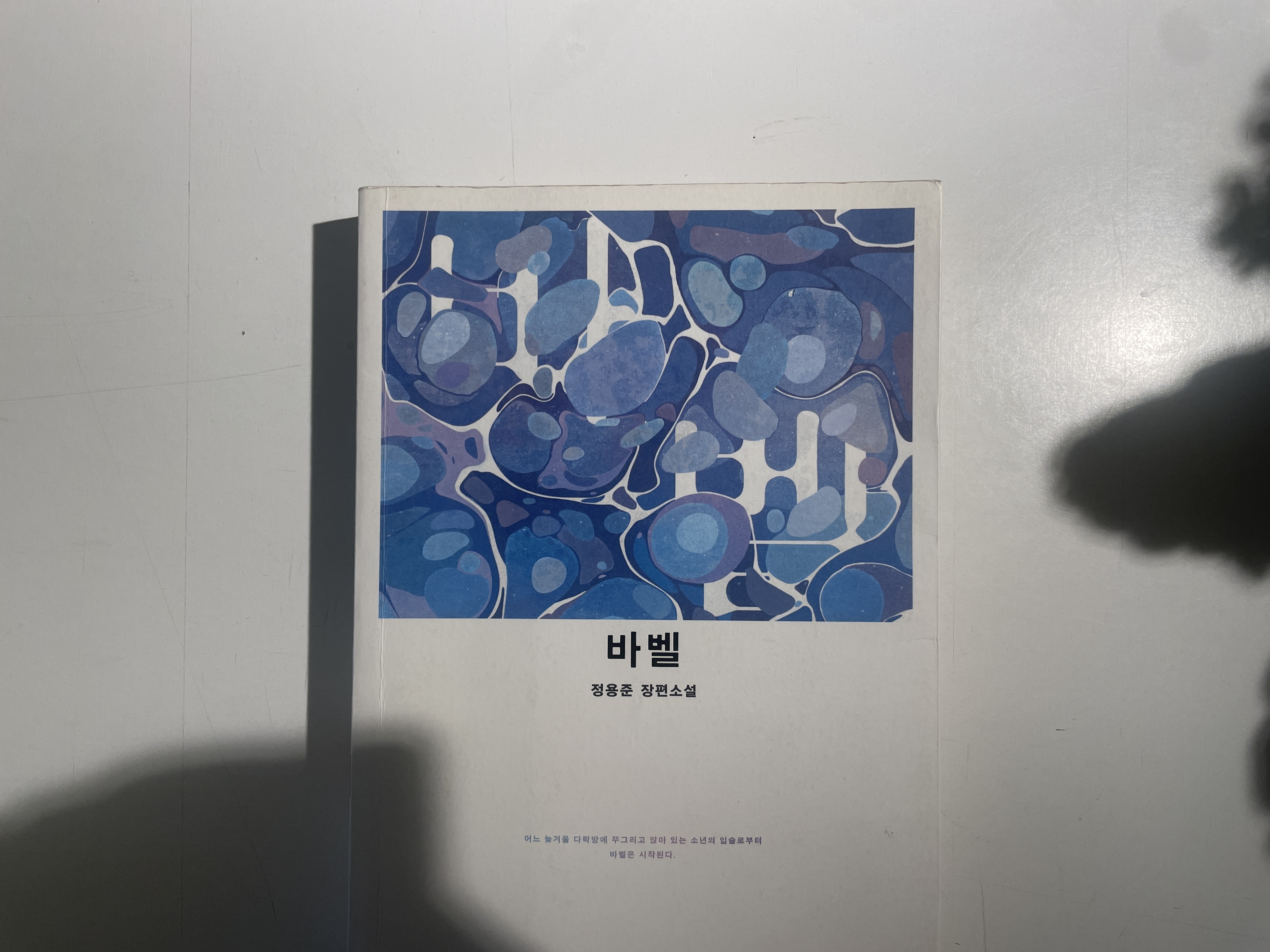
언어는 인간의 존재이자 고향이지만 말은 그것으로 튕겨 나온 날카로운 화살이고 집 떠난 탕자와도 같습니다
언젠가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빠 서재에 꽂혀있던 정용준의 소설 《바벨》을 찾았다. 오래전 나의 형제가 샀던 책이다. 자녀들이 독립하여 집을 떠나고 한해 한해 지나면서 물건들이 조금씩 정리되지만, 아빠 서재의 책꽂이는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가 아직 치우지 못한 흔적들로 엉켜있다. 이 책이 아직 여기 있었구나 - 하며 조금 읽다가 독일로 가져올 때 챙겨 왔다.
《바벨》은 언어와 존재, 인간의 인식에 대한 깊은 사유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작품 속 인물들은 말과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물리적 실체와도 같은 존재로 인식하며, 이를 통해 인간 내면의 모순과 분열을 들여다본다. 주인공 슈만에게 말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실제로 공기를 뚫고 나아가는 실체적 힘으로 다가온다. 작품 속 묘사처럼 “그는 말을 하나의 물리적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마치 망상증환자가 유령을 실제로 존재하는 육체로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말은 그의 인식 속에서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재하는 분자운동과 유사한 존재로 자리 잡는다. 공기 중에 떠서 앞으로 나아가는 말은, 산소나 질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어떤 실제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 강력한 실체감에도 불구하고, 말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인식과 분리되어 있으며 왜곡을 피할 수 없다. 작품은 이를 “말은 언어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식과 개념은 말을 통해 전달되는 동시에 깨지고 왜곡됩니다.”라고 설명한다. 말은 인간의 내면을 배신하며, 날카롭고 공격적인 껍질에 불과하다. 이는 인간이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애쓰는 동시에, 정작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음을 보여준다.
바벨의 언어는 사실상 언어의 기원을 송두리째 망각해 버린 언어, 그리하여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담아낼 능력을 박탈당한 불구의 언어와 다를 바가 없다.
반면 동물에게는 말이 없다. 그들의 울음과 행동은 내면과 외면의 분리가 없으며, 인간이 언어로 인해 잃어버린 직관과 침묵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작품은 이를 통해 언어를 통한 소통의 한계와 인간성의 본질을 동시에 성찰하게 한다.
작품 속 분열의 이미지 또한 주목할 만하다. 슈만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아는 폭력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드럽고 예민한 인격일지도 모른다. 이는 인간의 내면이 단순히 갈등과 충돌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분열 속에서도 새로운 감각과 이해가 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공통 감각’이라는 단어를 통해 작품은 언어가 가진 환상적 가능성을 탐색한다. 공통 감각은 단어가 육체를 입은 것처럼, 언어는 때로는 시적이고 환상적인 경험을 실제로 구현하는 힘을 지닌다. 단어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 감각적 실제로 전환되는 순간, 독자는 언어와 존재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루소는 그의 짧은 저서 <언어 기원에 대한 시론>에서 이렇게 쓴 바 있다. 인간이 말을 하게 된 최초의 동기가 정념이었던 것처럼, 최초의 표현들은 비유였다. 형상적인 언어가 가장 먼저 태어나야 했다 (언어의) 고유한 뜻은 마지막에 생겼다. 사물들의 참모습을 보고 나서야 우리는 그것들에 진짜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되었다. 사람은 먼저 시로서 말을 했다.
《바벨》은 인간과 언어, 말과 실재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사유를 촉발하는 소설이다. 말이 갖는 실체적 힘과 한계, 그리고 인간 내면의 분열과 감각적 경험을 섬세하게 엮어, 독자로 하여금 언어와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 소설은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 언어의 철학적 의미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문학적 사유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용준의 시각적 문체는 인물들이 토하는 펠릿의 형태나 그 냄새까지 느껴지게 한다. 그리고 그 냄새는 매우 비릿하지만 자꾸 맡아보게 된다.

《바벨》, 정용준, 문학과지성사, 2014.